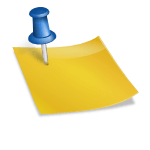두 개의 세계 – 이동우
다초점 렌즈로 펼쳐지는 시야
미로처럼 꼬인 손바닥의 균형을 봐
손안으로 깊숙이 들끓는 거리를 묶다
만화경에서 나를 꺼내
가까운 세계
먼 세상
새 안경은 어떠냐고 묻는 P에게
나는 길에서 더듬거리는 말을 끊고 “단축이 너한테 어울린다”고만 했다.
(이동우 시집 “서로의 비명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나?”)
노안에 대하여
오랜만에 만난 선배는 머리를 염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. “회복했어?” 내 웃는 말에 그는 몸을 곧게 펴며 “의도한 게 아닌데 아내가 계속 그렇게 말한다”고 말했다. 좋아 보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.
인사를 마치고 나는 작품의 열린 세상으로, 선배는 책장이 가득한 시의 세계로 간다. 긴 침묵. 나는 그가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며 올려다보았다.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그는 안경을 들고 결혼 수첩을 봅니다. 노안이 왔습니다, 선배. 평소 같으면 웃으면서 놀리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. 가슴 어딘가에서 손끝까지 따끔거림이 흘렀다. 첫 데이트라면 몇 살로 보일까요? 그런데 내 눈에는 선배님이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다. 나이는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. 원효나 무학의 해골물이 아니라도 마음의 문제, 외모의 문제가 아닐까요? 반면에 전성기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의미의 노안일 수 있습니다.
조금 후에 그가 시집 값을 지불하려고 했을 때 나는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다초점 렌즈를 받고 싶지 않은지 물었습니다. 그는 주머니에서 안경 케이스를 꺼내 보여줍니다. 안경은 이미 들어 있습니다. 나이가 들면 적응이 안 된다며 또 한 번 웃었다. 그게 우리의 나이입니다. (시인 유희경, 서점)